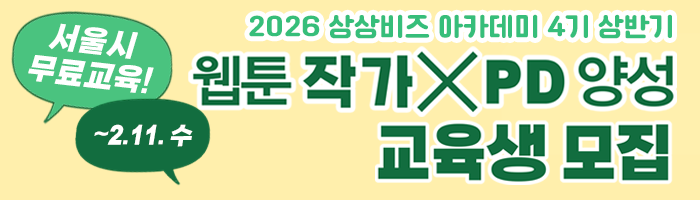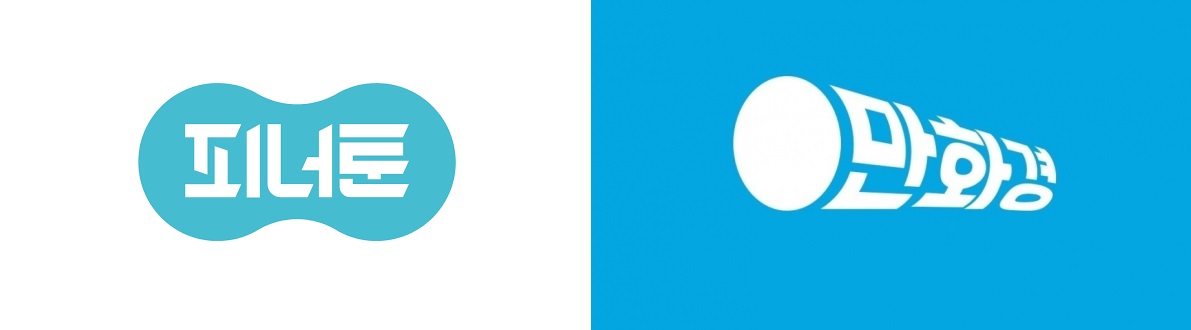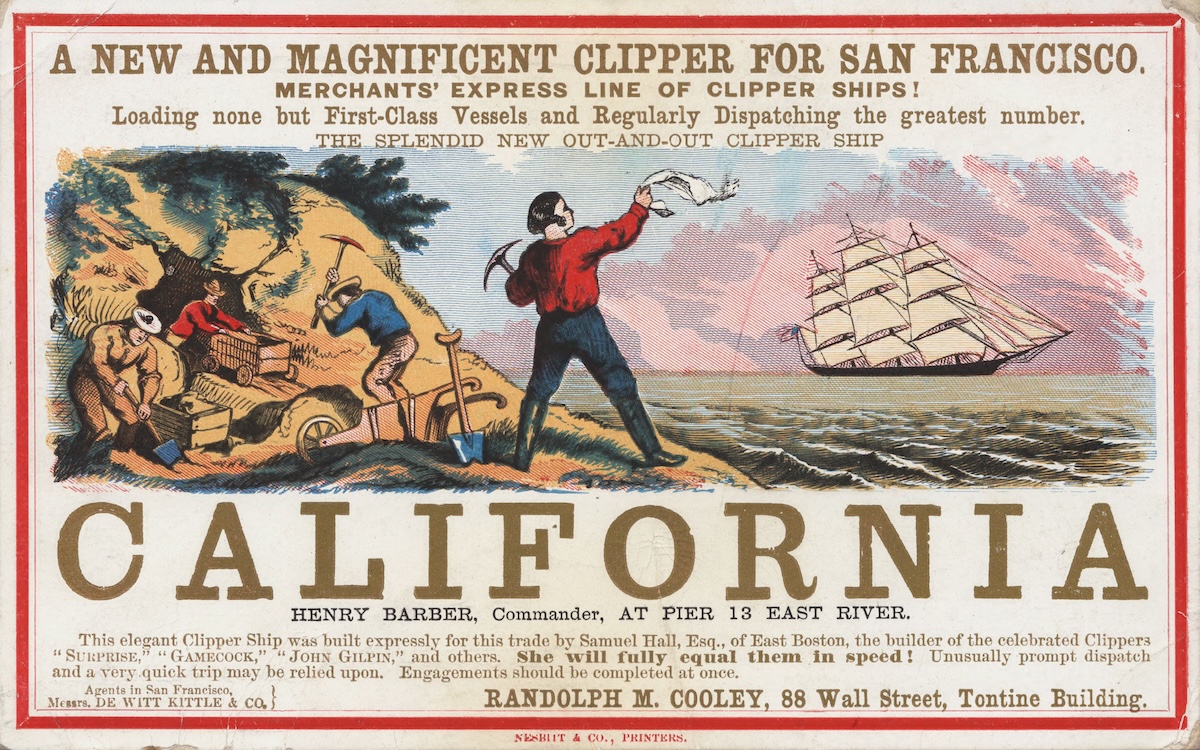지원사업 시즌에 쓰는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

지원사업이 제철입니다. 여기저기서 같이 뭘 해보자는 연락이나, 아니면 어디에 이름을 올려도 되겠느냐는 연락이 옵니다. 지원사업 시즌의 풍경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올해 지원사업은 “2025년 창작초기단계 만화웹툰 콘텐츠 공모”, “2025년 다양성만화 제작지원(창작자)”, “2025 다양성만화 제작지원(매니지먼트)”, “2025년 만화웹툰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2025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사업 플랫폼기관 모집공고”, “2025년 소수정예 웹툰작가 양성사업 플랫폼기관 모집공고” 등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시니어 멘토링 지원사업”,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 “만화원작 콘텐츠 지원사업”, “만화인 헬프데스크”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중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원사업들이 공모가 끝났거나 공모중입니다. 이를테면 “2025년 창의인재동반사업 멘토링+사업화 지원 플랫폼기관 모집공고”,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멘토링 지원 플랫폼기관 모집공고”,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선도형, 진입형)공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홍보웹툰 제작지원이나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지원사업은 별도로 보더라도, 꽤 많은 지원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지원사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누군가에겐 단비 같은 사업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인생을 건 도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쩌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지원사업을 이야기할 때 같이 묶여서 나오는 말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 말은 지원하는 주체가 지원받는 대상에게 바라는 것 없이 지원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것이 지원할만한 일이면, 그저 지원할 뿐 다른 것을 바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지원하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3월에 기획한 작품을 들고 4월에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5월부터 작품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완성 작품이 공개되는 것은 11월~12월입니다. 그 중간에 얼만큼 작품을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하고, 이야기의 완성도가 아니라 ‘분량’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참신한 시도, 새로운 관점이나 예술적 실험보단 행정 처리에 능숙하고, 일정 분량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만화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유리하기 어려운 판이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자체가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시즌에 기획서 검토를 부탁하는 작가들에게서 그 그림자를 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이런 주제를 다뤄도 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래서 소재를 수정했는데 어떤지 봐달라’는 이야기 말이죠. 물론 선정되는 작품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작가보다는 작품 제작, 기간내 완성이 목표인 사업입니다. 만화책 제작을 지원하고, 그 제작된 만화책은 고스란히 작가가 재고로 가져야 하는 지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어야 예산을 쓸 수 있고, 정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돈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흐름을 읽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의 ‘진흥기관’ 들은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을 대행할 뿐, 새로운 지원방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이라면 그렇게 만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 작품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원, 진흥이란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시도하지 못하는 곳에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지 말이죠. 물론 이건 단순히 만화와 관련된 진흥기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원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모든 지원사업 체계의 문제기도 하니까요.
* 독립이 불가능해진 독립시장
지원 자체가 간섭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 작품을 지원하다 보니, 새로운 작가를 찾고 투자하는 일이 ‘지원사업의 할 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만화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고 웰메이드 작품을 만들어 도전하는 일은 지원사업에서 할 일로 여겨 투자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용 아이템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지원사업이라는 풀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장과 격리된 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일회성으로 쓰이고 마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사업이 아니면 나오지 못했을 만화라는 말은 일견 낭만적이지만, 지원사업 맞춤형 아이템들이 나온다면, 또 그것이 시장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예시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만화 매거진 중에는 ‘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웹 연재를 하고, 그 중에서 작품을 뽑아 단행본을 제작해 판매합니다. <고르고 13>으로 유명한 사이토 다카오가 설립한 사이토 프로덕션의 출판사업부에서 분리된 리이드사(社)는 사이토 프로덕션의 작품을 출간, 재출간하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2014년 웹만화 사이트인 ‘토치’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토치 편집부는 “우리는 ‘대안적 표현’과 ‘우리들의 노후를 위한 길’을 찾아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에 만화를 읽다가 이제 중-노년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책을 내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이던 곳에서 2030을 타깃으로 한 만화를 연재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연재-완결후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소개된 작품 중에는 <에도의 장인들>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당위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그건 지원사업이 하니까’라고 얘기하기 좋은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토치는 큰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가늘고 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물론 이런 모델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본위의 지원, 그리고 작품 제작을 지원해서 무엇을 할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콘텐츠에 대한 이해, 심사 단계에는 있나
심지어는 플랫폼 지원사업에서 ‘한류 웹툰 플랫폼’을 지원하겠다고 2억원을 타 간 업체가 중국 웹툰을 수입하는데 돈을 썼다가 콘텐츠진흥원이 지원금 환수를 요구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기사(‘한류 웹툰 플랫폼’ 만들라고 국고 2억 줬는데 中 웹툰 수입… 法 “속인 것 아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억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운영의 관점에선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웹툰 플랫폼에는 작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작품들을 유지하는데만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매일 연재되는 작품 10개, 일주일 총 70작품에 회차당 지급되는 MG가 100만원이라고 해도 한달이면 2억 8천만원입니다. 작품을 수입하는데 비독점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그 플랫폼은 어떤 매력을 갖게 될까요? 2억원으로 플랫폼에서 국내 인기작 수출, 웹툰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애초에 심사 단계에서 웹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건지 의문인 상황인 겁니다.
작품은 어떨까요? 어떤 작품이, 작가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면접 단계에서 작가가 가진 비전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단계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흔히 ‘다양성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지만,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의 경험담을 풀어놓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다양성에 대한 작가들의 고민이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담다디’로 유명한 가수 이상은씨는 2003년 KTV ‘피플 투 피플’ 인터뷰에서 “나는 가요톱텐에서 1등을 하고 싶은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얘기를 솔직하게 했을 때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순수하게 음악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송 위주로 활동하는 메이저들이 저는 좋게 보인다. 그런데 그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디가 존재해야 한다. 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균형이 맞아야만 인디에서 아이디어를 주게 되고, 건강하게 순환이 되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집니다. 예술가들이 ‘내 얘기를 솔직하게 했을 때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상은씨의 인터뷰는 22년의 시간을 지나 다른 분야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네요.
정리해보면, 작품을 지원해서 재고로 남게 되는 지원보다 그 책을 판매하고, 소개하고, 독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그걸 위해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도 겸업 작가활동에 더 열린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지원사업 평가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건 없잖아요? 행정에서는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민이 있는 법입니다. 그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게 우리가 해야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집니다. 다음 칼럼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