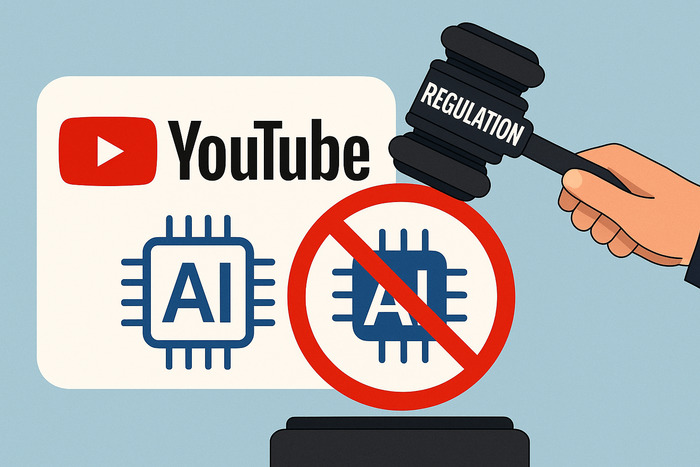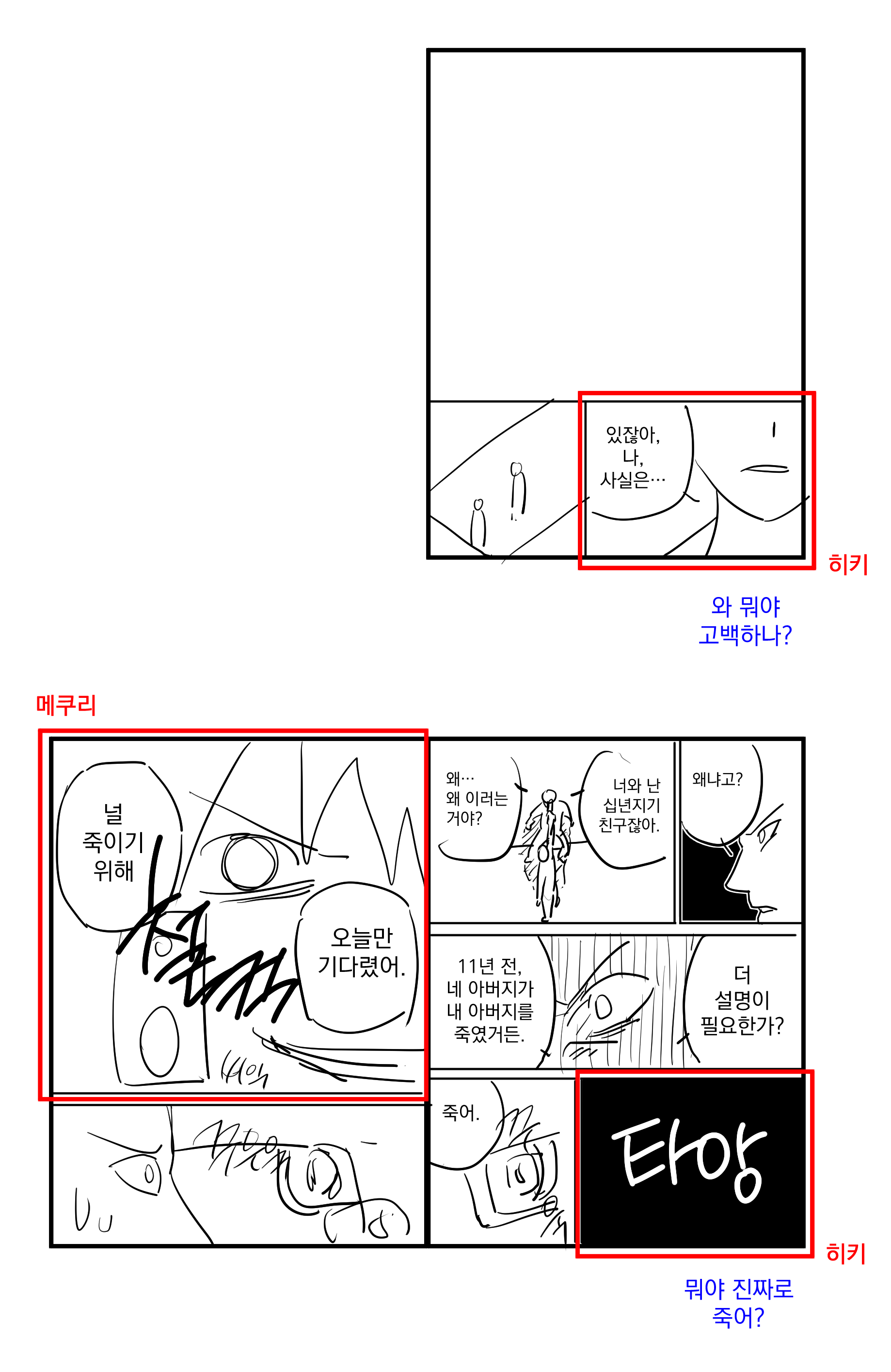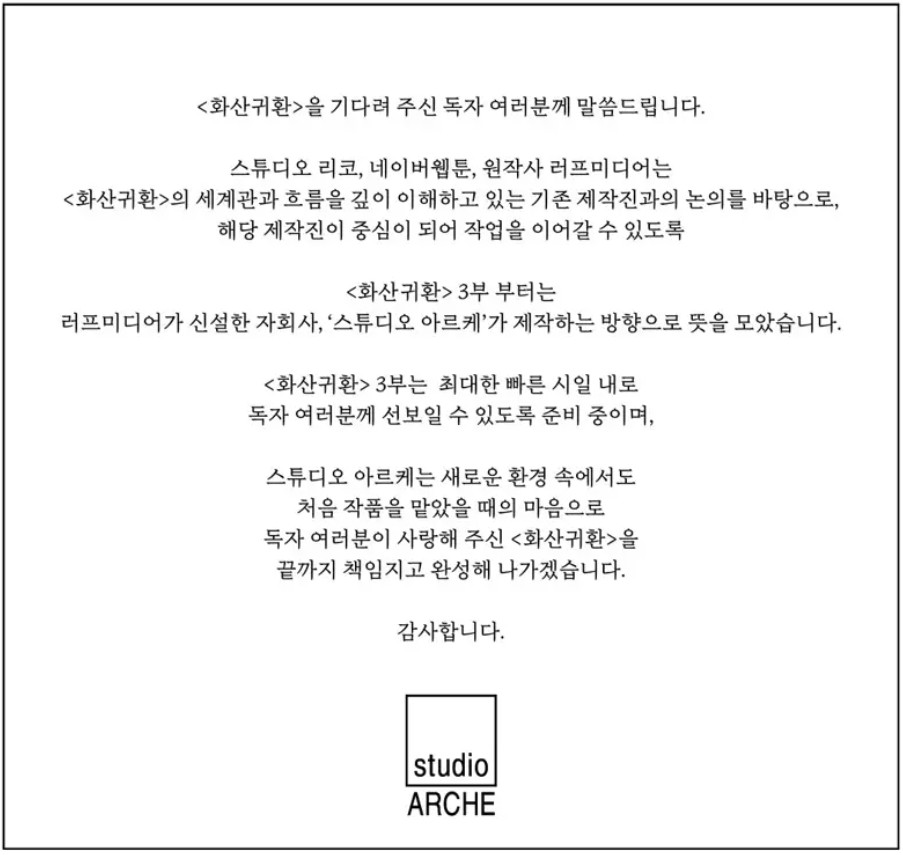[올해의 출판만화] 접촉과 치유의 스토리텔링 - "믿을 수 없는 영화관"

황벼리 <믿을 수 없는 영화관>, 2024, 한겨레출판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은 이야기, 연출, 작화에 있어 모두 아름다운 충만함을 보여준 만화다. 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가의 꾸준한 시도를 먼저 살펴봐야한다. 2017년 <다시 또 성탄>은 제목처럼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6편의 단편에 담았다. 만화를 그리고, 스스로 책을 만들었다. 나 홀로 있는 크리스마스지만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부드러운 흑백의 선으로 묘사했다. 2018년 두 번째 만화책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에서는 전작에서 보여준 스타일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다. 첫 번째 만화책이 그리드를 지키는 규범적 만화의 연출이었다면, 두 번째 만화책은 정갈한 칸 나눔 대신 페이지를 과감하게 활용했다. 쓸쓸하지만 다정했던 전작과 달리 표제작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와 이어지는 단편 ‘사탕의 맛’은 현실을 처절하게 드러냈다. 순간순간이 화자에게는 힘겨운 시간이고, 그걸 보는 독자도 같은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2019년 세 번째 책 <사진 한 장의 무게>는 ‘사진 한 장의 무게’와 ‘NPC 비긴즈’ 단편이 앞뒤, 우철과 좌철로 진행된다.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가운데서 만나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와 다른 형식적 실험이지만 독자들이 충분히 고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도다. 2020년에는 아코디언 접지 만든 16쪽짜리 단편 두 편 <서운한 마음>(쪽프레스)과 <보통권>(유어마나)을 냈다. 첫 단편집부터 다섯권의 만화책이 모두 단편 만화책이었다. 단편은 모두 ‘우리/시대’를 보여준다. 짧지만 늘 이야기로서의 삶을 담는다. 스토리셀링이 득세하는 시대에 파동을 느끼는 스토리텔링이다. 연출에서 매번 새로운 고민과 시도를 보여준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작 단계에서 빈 공간을 사유한다. 이렇듯 황벼리 작가는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쌓아올렸다. 이야기, 작화, 조형, 연출에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 2024년 첫 장편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을 완성했다.
기존 단편들이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아날로그 도구로 직접 그리거나 아날로그 텍스처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에르제 이후 서구의 만화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꾸준히 활용한 클리어 라인(Clear line)을 보여 준다. 의도적으로 모든 선을 같은 굵기로 끊김없이 그린다. 그림자나 해칭과 같은 음영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선 안을 단일한 색으로 메꾼다. 하지만 공간을 묘사할 때 배경은 생략하기 보다 정확하게 묘사한다. 황벼리 작가는 클리어 라인 기법을 기반으로 한발 더 나아가 주인공 인물을 미디엄 숏으로 잡을 때는 의도적으로 배경을 생략하는 미니멀 그래픽(Minimal Graphic) 스타일을 보여 준다. 미니멀 그래픽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칸 나누기도 1쪽을 (가로╳세로 기준) ‘3╳4, 2╳3’를 기본 그리드로 칸을 분할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그리드를 기반으로 칸을 나누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 없이 명확하게 구성된 칸의 구조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한국만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황벼리 작가는 미니멀 그래픽 스타일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성공한다.
한병철은 <서사의 위기>(다산북스)에서 벤야민의 ‘사유 이미지’에 나온 “아이가 아프다.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데려다 놓고 아이의 옆에 앉는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치유의 스토리텔링’을 말한다. 깊은 내면의 고민, 침참하는 시간, 완전한 고독의 이야기는 치유의 스토리텔링이기도 하다. 내면의 고민(을 안고), 침참하는 시간(속에서), (그리하여) 완전한 고독(을 견디는)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에 접촉하기 때문이다. 한병철은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접촉의 빈곤은 결국 세계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과접속의 시대 사람과 사람의 깊은 유대가 사라지고 접촉의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스토리텔링이다.

<믿을 수 없는 영화관>에는 세 주인공 곽풀잎, 고무섭, 이이소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교차하며 보여준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장치로 ‘영화’를 활용한다.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화면에 투사되는 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제공한다.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은 영화관을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로 만든다. 아무도 없는 극장에 손님이 찾아오고,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여행, 가방>의 표를 사 극장에 들어간다. 가방이 된 할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는 할머니 이야기인 영화는 바다 장면에서 끝나고, “오래전부터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그곳이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라고 생각했던 영화관을 지키는 곽풀잎은 영화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그곳이 그토록 오고 싶었던 다른 세계임을 알게 된다. 영화관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고, 텅빈 영화관에는 곽풀잎만 남았다. 함께 살다 곽풀잎이 다른 세계로 떠나고 홀로 남은 고무섭은 곽풀잎이 떠나도 여전히 카페 매니저로 일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풀잎의 언니가 카페로 찾아와 동생과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물어본다. 고무섭이 스물네번째 생일 선물로 준 꽃다발을 받고, 평범하게 출근한 곽풀잎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끝이었어요.” 고무섭은 곽풀잎과 만남을 회상했고, 1년 전에 남긴 마지막 인스타 사진을 바라본다.
학교를 휴학하고 보일러 상담사로 일하는 이이소는 극장에서 곽풀잎을 만난다.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이소가 복학을 하기 위해 교수 면담을 하러 간날, 후배에게 강제 추행을 한 배명한 강사의 탄원서를 부탁받은 날 극장을 찾아 곽풀잎을 만난다. 다시 극장을 찾아간 이이소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곽풀잎을 만난다. 곽풀잎에게 극장 앞은 바다, 이이소에게는 평범한 길이다. 이이소는 배명한과 얽힌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곽풀잎과 상담을 한다. 고무섭은 길을 잃고 떠도는 강아지를 구해 임시 보호를 시작했다. 곽풀잎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세 주인공은 극장 매니저(곽풀잎), 카페 매니저(고무섭), 휴학을 한 상담원(이이소)으로 일한다. 모두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대면 서비스 직군이다. 서비스직 노동은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을 대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막대한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숨겨진 노동이다. 이야기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우리는 세 주인공의 일상, 내면 그리고 꿈을 알게 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곽풀잎의 조용한 고백이 마음을 울린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곽풀잎, 고무섭, 이이소 세 명의 시점을 오가고,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를 오가는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게 읽힌다. “지나간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이잖아요. 지나간 시간 위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고여있던 시간이 마르면 반짝이는 순간의 결정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탕 같은 거예요. 영원이 녹지 않는 사탕요.”(212쪽)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 미미를 기억하는 미래(무섭이 근무하는 카페 주인의 딸)이 무심히 들려준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우리 기억, 그리고 화자의 기억들이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억은 우리를 접촉시키고, 치유한다.
글 : 박인하(만화평론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기획회의> 621호(2024.12.5)에 수록된 리뷰입니다.